드라마 못보는 사람들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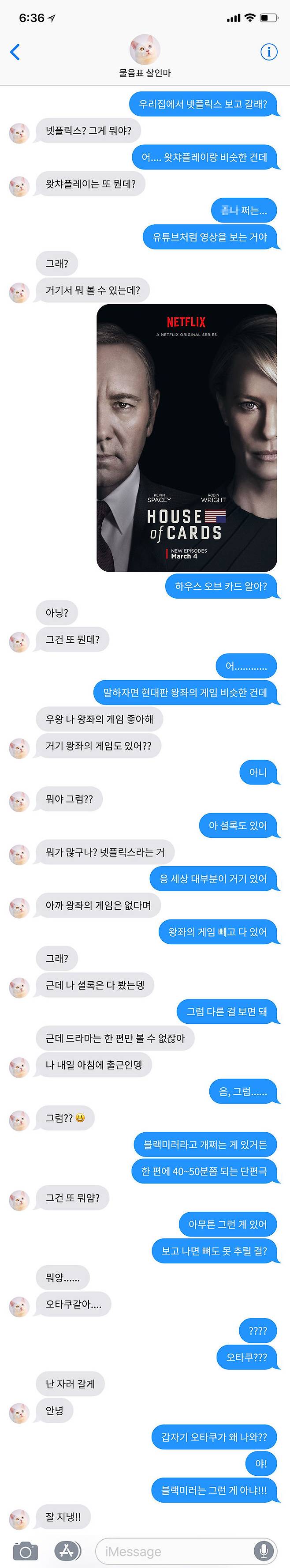
안녕, 김리뷰다. 디에디트에 연재를 시작하는 첫 글이라 칼마감을 해봤다. 앞으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오늘 주제는 드라마. 솔직히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드라마 볼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영화를 보자는 주의다. 이런 기호는 어디까지나 내 성격 때문이다. 영화의 길이는 천차만별이지만, 한 편 안에 어떻게든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다. 반면 드라마는 템포가 너무 쳐진다고 할까? 전개 자체를 짧게는 수 편, 길게는 수 십 편으로 늘려 놓아서 사람을 안달복달하게 만든다.
난 견딜 수 없다. ‘다음 편에 계속’이라는 명령어를 따라 일주일을 기다려야하는 일이나, 곧 자야 할 시간인데 아직 남은 에피소드가 일곱 여덟편이나 남아있는 상황들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였다. TV를 부수거나, 밤새도록 시즌을 정주행하거나, 되도록 드라마를 멀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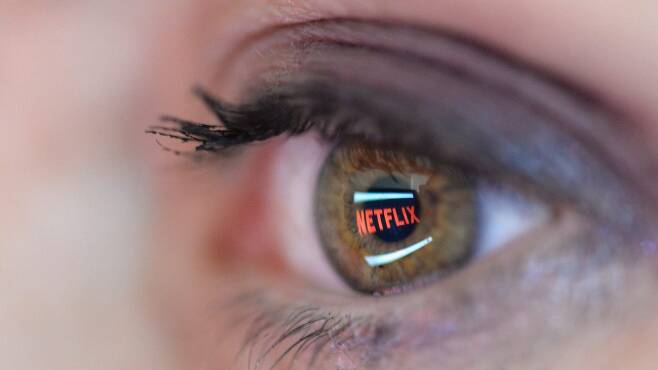
요컨대, 나는 멈출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시리즈물을 보는 게 힘들다는 얘기다. 어쩌면 멈출 줄 몰라서 이 지경 이 꼴이 됐을지도 모른다. 내가 빠져나오지 못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길면 괜히 부담이 된다. 그 시간을 아껴서 굉장히 대단한 역사를 이룰 것도 아니면서. 그 사이에 지구멸망 위기나 3차 대전 발발 같은 일이 일어날 것도 아닐 텐데. 아무도 쫓지 않는데 쫓기는 마음으로 살곤 한다.
넷플릭스의 간판 작품인 <하우스 오브 카드>, <지정생존자>, <기묘한 이야기> 등은 대부분 장편 드라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콘텐츠에 제대로 입문하기까지 망설임이 길었다. 결제는 이미 오래전에 했는데도 말이다. 다음날 강연을 앞두고 <기묘한 이야기> 첫 번째 시즌의 재생 버튼을 만지작댔다. 그러자 떠오르는 이미지… 다음날 아침 퀭한 눈으로 부랴부랴 강연 주최 측에 연락을 해선, 도저히 이 컨디션으론 강연을 못하겠다,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암에 걸린 것 같다, 미안하지만 위약금을 내는 대신 강연을 취소… 아, 안 돼. 그럼 내 커리어는 끝이다. 더 끝장날 커리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정말 끝장이야. 결국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다음날 강연을 무사히 마치는 대신 아직도 <기묘한 이야기>를 보지 못했다. 꽤 슬픈 이야기다.

그러나 때마침 발견한 <블랙 미러>가 완벽한 대안이 됐다. 훌륭한 시리즈를 만났을 때 홧김에 끝까지 봐버리고 싶은 마음은 별 수 없다. 다만 <블랙 미러>는 에피소드마다 세계관, 설정, 등장인물, 메시지까지 모두 바뀐다. <블랙 미러>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시리즈라고 봐도 되겠다. 각 에피소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지금보다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달한 근미래를 다룬다는 것 정도. 묘하게 현실을 넘나드는 SF. 올라가는 크레딧과 함께 메시지를 되새김질하는 재미가 있다.

‘다음 편을 안 보면 넌 죽어!’ 같은 연출도 하지 않는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떡밥을 뿌리지도 않는다. 어차피 편당 보통 사오십 분, 길어야 한 시간을 좀 넘는 시리즈다. 딱 회수할 만큼 떡밥을 뿌린 다음, 시간 되면 착착 주워 담는 느낌이다. 처음부터 정해진 조각의 프라모델인데, 짧은 시간을 들여 완성하면 놀라운 모양이 된다고 할까? 한 시간만 투자하면 완성된 프라모델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나쁘지 않은 장사다. 덕분에 <블랙 미러>는 당장 다음 편을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갑갑하고 안달 나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롭다.

대신 신뢰 같은 게 생긴다. <블랙 미러>니까. 내가 무료할 때 한 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어떻게든 새로운 뭔가’를 가져다 줄 것만 같은 믿음.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같은 신뢰 관계다. <블랙 미러>는 <블랙 미러> 그 자체, 나아가 넷플릭스와의 신뢰관계를 능숙하게 쌓아올린다. 내가 넷플릭스의 입문 시리즈로 <블랙 미러>를 추천하는 이유다. 짧고, 강렬하고, 흥미진진하고, 뭣보다 순서대로 볼 필요도 없다.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 결론을 못 내서, 꺼내놓은 걸 수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확실한 결론이 왜 필요해? 같은 식이다. 그래서 간혹 ‘이게 뭐야?’싶은 상황에 크레딧이 올라가는 에피소드도 있다. <블랙 미러>가 추구하는 것은 잘 빠진 메시지가 아니라 불편하고 까칠까칠한 질문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시리즈에는 ‘덕질’할 대상도 없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효과도 없다. 도리어 뇌에 얼룩을 묻히는 역할이다. 닦아내려면 스스로 생각해야지. 마치 콘텐츠 천지인 넷플릭스의 바다를 가르고 와선,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 미러>는 최고의 시리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세 편을 뽑아봤다. 내 리뷰가 늘 그랬듯이, 극도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정됐다. 솔직히 에피소드들의 우위를 정하는 것이 좋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별 수 없잖아.

1. 하얀 곰 White bear (시즌2)
– 불편한 카타르시스. 별 세 개 반.

2. 블랙 뮤지엄 Black Museum (시즌4)
– 처음부터 끝까지 검은색. 별 네 개.

3. 화이트 크리스마스 White Christmas (시즌2)
– 다 보고 일어설 힘도 없다. 별 다섯 개.
